
어쩌면 그는 이틀 병가를 냈다. 희숙은 병원에 가서 영양제도 맞고 화장품 가게에 들러 새로 나온 기초화장품과 색조 몇 가지를 샀다. 항상 스킨, 로션만 바르고 민낯으로 다녔는데 음악회 이후 화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권지호에게 부끄러운 옆지기가 되고 싶진 않았다. 화장품 가게 옆에 ‘아가방’이란 아기용품 브랜드가 있었다. 희숙은 작은 손발싸개, 배냇저고리, 젓병, 유모차 등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만약 출산하게 되면 어디서 몸조리하지…? 엄마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희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대학의 낭만과 지성을 포기하며 노동 투쟁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외롭고 고단한 싸움을 보상받을 날만 기다렸다. 위장 취업해 노조 만들고 노조교육선전부장자리까지 꿰찼다. 이것이 보상일까. 그다음은? 아버지께 죄송했고 동생들에 미안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까지 지워 가며 쟁취하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신이 없었다.
희숙은 지금 뱃속 아기가 고단하고 지친 희숙의 삶을 단절시키는 보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고도 권지호는 바빴다. 울산과 부산, 두 번의 지방 출장을 마치고야 그는 회사에 나타났다. 희숙은 오후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 조심스럽게 그의 사무실을 노크했다. 권지호는 의자를 뒤로하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가 희숙에게 들어오라 손짓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고 있었다. 낮고 차분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대와 통화했다. 희숙이 들어온 걸 알면서도 그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희숙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그가 통화를 마치길 기다렸다. 그는 희숙이 소파에서 기다리는 걸 보고, 의자를 창문 쪽으로 돌린 채 통화를 이어 갔다. “응, 그래. 알면서 그래, 알아서 해, 뭐든 오케이지. 엄마가 좋아하겠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 나랑 상의하지 말고 엄마랑 해. 사고 싶은 게 뭔데, 엄마가 좋아하실까?” 엿들은 내용으로 봐서 누나와의 대화인 듯했다. 권지호가 희숙이 듣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상대는 누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누나와 통화한다고 생각하기엔 지나치게 감미로운 내용도 있었다. “그런 건 내가 다 해야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동안 못 했던 거 다 보상해 줄게. 나만 믿어 봐,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희숙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희숙과 최근 잠자리에서도 사귀던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갔다가 헤어진 후로 사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 이후에 권지호가 누굴 사귈 시간이 있었을까. 권지호는 음악회 이후 외국 출장, 국내 출장으로 바빴다.
희숙이 권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꿰고 있진 않았지만 그가 출근해서 하는 일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퇴근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 희숙을 만나는 일 외엔 다른 여자와 교제하고 있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동안 못 했던 거 다 보상해 준다니…? 무슨 말일까. 그건 누나에게 하는 말이 아닌 듯했다. 더구나 누나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동생인 권지호와 의논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았다.
[글 박선경 일러스트 임유이]
후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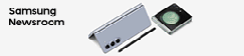


 서울 25º
습도 70%
서울 25º
습도 70% 수원 22º
습도 70%
수원 22º
습도 70% 대전 26º
습도 75%
대전 26º
습도 75% 제주 23º
습도 100%
제주 23º
습도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