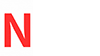▲ 김태형, 2006년 3월 전 가족 귀농
▲ 2012년, 귀농 7년차 농부
농사일에 한창 바쁜 2008년 여름, 해질녘 고구마 심은 밭을 빌려준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사는 집의 원래 주인인데 아들 따라 시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저희에게 밭을 빌려줬지요.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이를 참느라 꼭꼭 눌러 말하는 아주머니의 표정엔 위압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대화는 부드러웠지만 결국 “밭 빌려줬더니 풀밭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로 소작농을 코너로 몰아넣었으니까요.
풀 천지된 고구마밭 동네사람들 구경거리
“오늘은 일찍 들어왔나벼? 그 밭에 뭘 심었어?” “고구마요”
“동네사람이 그 밭에 가봤냐고 물어 보길래 안가봤다고 했지. 이미 빌려준 건데 내가 가볼 이유도 없고... 근데 동네사람이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 풀이 보통이 아니라고... 꼭 풀 매요 잉?” “네”
“거긴 길가 땅이라 사람들이 보면 챙피한 일이니까 꼭 매요 잉” “네”
“요즘 바쁜 일은 다 끝났슈?” “아니요. 금요일에 대파 심는데요. 대파 심고나서 풀 뽑을께요”
“풀씨 떨어지면 몇년 가니 꼭 매요 잉?”

▲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라고 할만큼 한 여름철이면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란다. 풀을 보면 농부의 작물에 대한 애정이 확인된다. 사진은 고추밭 고랑 한 가운데 난 풀. 이 정도면 게으른 농군이다. <사진=필자제공>
밭에 난 풀을 뽑으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모습을 보고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밭의 풀이 어른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고구마를 심은 밭은 대부분 지팡이로 유명한 명아주와 바랭이들로 점령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동네 구경거리가 된 우리 밭. 동네 한 어르신은 ‘‘송악(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아산시 송악면)에서 이런 밭은 처음 봤다’며 ‘차라리 고구마를 포기하고 지팡이를 키워 팔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고구마를 포기하고 지팡이를 팔지”

▲ 풀뽑기를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귀농에서 성공하려면 귀찮고 번거로운 풀뽑기부터 익숙해져야 한다. <사진=필자제공>
농촌에서 풀은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사실 내가 봐도 한심한데 동네사람들은 오죽하겠냐 싶을 정도로 풀은 귀농한 사람들에게 ‘맨붕’을 안겨주는 주범입니다. 잡초가 많으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김매기입니다. 이 밭에서 풀을 매고 있으면 저쪽에서 풀이 자라 여름철 김매기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뭐하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풀이 한참 자라고 나서야 겨우 호미를 잡게 되는 것이 저희의 농사일 입니다. 나중엔 호미로도 안 돼 낫으로 땅을 긁어냅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되는 일은 매년 반복됩니다.
풀을 보고도 김을 매지 않으면 하농?
때를 놓치면 2~3배의 고생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농사일 인가 봅니다. 그래서 ‘1년 씨앗이 7년 잡초’라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속담에 ‘상농(上農)은 풀을 보지 않고 김을 매고, 중농(中農)은 풀을 보고야 비로소 김을 매며, 풀을 보고도 김을 매지 않는 것은 하농(下農)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풀. 풀. 풀... 아마 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귀농인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년, 이년 풀농사를 반복할수록 처음에 가졌던 풀에 대한 미움은 신기하게도 애정으로 바뀝니다.

▲ 농부에게 풀은 정말 얄미운 존재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풀은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된다. 사진은 파밭에서 김매기 하는 모습. <사진=필자제공>
아마 풀이 자라는 동안 농작물도 함께 자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겠지요. 풀이 건강해야 농작물도 건강할 수 있다는 일종의 동질의식이라고 할까요? 잡초도 제대로 알면 반찬도 되고 약도 되고 거름도 된다고 합니다. 풀이 미워 제초제를 뿌리는 것 것보단 이를 알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자연을 닮은 농사라고 믿습니다.
농작물과 풀이 함께 크는 그런 농사 어디 그런 농사는 없을까요? 풀을 보고도 김을 매지 않아 풀 천지를 만들고 있는 하농(下農)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후원하기